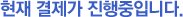이벤트
g: Design+
말과 침묵
글. 오창섭

얼마 전, 몸담고 있는 한 학회에 참석하였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처음 보는 이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일은 학회가 주는 행복한 경험이다. 흥미로운 연구와 연구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학회의 매력이다.
그런데 이번 학회는 말과 침묵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학회였다. 일반적으로 학회에서는 주제에 따라 발표 논문들을 모아 같은 방에서 발표하게 한다. 학회가 있던 날,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논문들이 발표되는 방에서 논문발표를 듣고 있었다. 논문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한 질문자가 발언기회를 얻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횡설수설에 가까웠다.
말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때문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말 자체보다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그 질문자의 말은 의미를 떠올리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말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모호한 질문에도 발표자는 나름 성의 있는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답변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른 질문을 청하였을 때, 앞서의 그 질문자는 거듭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였다.
이러한 풍경은 물론 학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의나 회합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만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끊임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이들 말이다. 그들의 행위는 말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꺼버린 TV화면을 마주한 이들처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간혹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관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몸짓일뿐, 마음으로는 ‘도대체 이 짜증스러운 상황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읊조린다.
여기서 우리는 말이란 것이 적어도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의미를 가진 말, 그래서 소통의 도구로 존재하는 말! 그것을 나는 ‘말하는 말’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모든 말이 ‘말하는 말’은 아니다. 의미 값이 없는 말, 소통을 기대하지 않는 말도 있기 때문이다. 말과 말하는 이가 있지만, 내용은 없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말이 그것이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침묵하는 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학회에서 그 질문자의 말은 ‘침묵하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침묵과 다르지 않는 말, 즉 ‘침묵하는 말’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자기 존재증명이야말로 그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평론가인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침묵은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Silence is more eloquent than words.)”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의 연장선상에 자리한다. 하지만 이제 침묵이 미덕인 시대는 갔다. 침묵은 무능과 무지의 표식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존재하지 않음의 기호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감추고,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할 이야기가 없어도 말을 한다. 아마도 학회에서 그 질문자 역시 말을 통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였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면서 말이다.
의미 없는 말을 해대는 또 다른 이유는 침묵을 못 견디는 감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도시는 온갖 소리들로 채워져 있다. 도시적 감수성을 내면화한 이들에게 침묵은 두려운 것이다. 만일 도시적 감수성을 내면화한 이가 조용한 시골마을을 찾는다면 고요함에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물론 잠시 동안은 그 고요함에 호기심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이내 지루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다. 물론 오늘날 지루할 만큼 고요함이 가득한 시골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시골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침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골 역시 도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 없는 시골, 고요하지 않는 시골은 이미 시골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골에 사는 이들도 어쩌면 도시적 감수성을 지닌 도시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디자이너들은 시골의 감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말이 필요한 곳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고요한 침묵을 즐기니까 말이다. 언젠가 한 국회의원이 “왜 디자인계는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 사람들은 요구도 많고, 의견도 많은데 디자인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우리 디자인계는 말에 인색하다. 사적인 차원에서는 말하는 그 자체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공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뿐이다. 현실 정치가 디자인을 유린할 때도, 디자인이 오해로 얼룩져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때에도 디자이너들은 침묵했다. 말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말이 필요한 곳에서 침묵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침묵은 아무 생각도, 아무런 할 말도 없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침묵, 그것은 ‘침묵하는 침묵’이다. ‘침묵하는 침묵’은 공허하다. 그러한 침묵이 자리하는 곳에는 소통도 없고, 미래도 없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침묵은 ‘침묵하는 침묵’과 다른 것이다. 그것은 많은 고민과 신중함이 배어있는 침묵이다. 나는 그것을 ‘말하는 침묵’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말이 없는데도 그 말 없음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침묵이 바로 ‘말하는 침묵’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디자이너들이 공적인 차원에서 취하는 침묵은 ‘말하는 침묵’일까?

오창섭 오창섭은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디자인과 키치』,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메타디자인을 찾아서』, 『인공낙원을 거닐다』, 『9가지 키워드로 읽는 디자인』, 『제로에서 시작하라』 등이 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메타디자인연구실(Meta Design Lab.)’을 운영하고 있다.
review
게시물이 없습니다
Q & A
게시물이 없습니다
shipping, exchange, return guide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