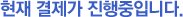SPECIAL FEATUREMUSIC & DESIGN / 음악 예술성과 동행한 앨범 커버
MUSIC & DESIGN
요즘 노래는 요즘 노래대로, 또 옛날 가요는 옛날 가요대로 불현듯 모두가 노래를 듣는 데 집중하는 몇 달이다. 음악보다는 반짝거리는 이슈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안타깝지만 어디 지금 뿐이랴. 엔터테인먼트와 쇼 비즈니스와는 별개로 음악 자체가 주는 감동은 항상 인류와 함께하며, 예술을 더욱 예술답게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며, 감히 뱉지 못하는 웅얼거리는 ‘갈망’을 해소시켜 주었다. 물론 음악이 소비되는 방식은 변화를 거듭해왔고, 그 변화에 따라 음반디자인도 현격한 쇄신을 필요로 했다. LP 시대에서 CD 시대로의 이행, 나아가 디지털 음원 시장의 정착을 거치며 음반 디자인은 ‘커버 아트’에서 썸네일 이미지로 그 가치가 축소/하락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작금의 상황을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소장성을 강화한 패키지의 강세는 음반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를 감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고 있으며,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 없이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 풍토는 곧 음반디자인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과연 그럴까. <지콜론>은 아이돌 가수 음반부터 홍대 앞 인디 뮤지션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총 15명의 음반 디자이너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음반 디자인의 오늘을 꼼꼼히 물었다. 물론 이 또한 상관없이, 음악이라는 비가시적 창작물이 디자인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환원되는 과정, 음반디자인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음악 예술성과 동행한 앨범 커버
글 임진모 음악평론가
<마법의 성>과 <편지>와 같은 애창곡을 작곡한 김광진은 지금까지 자신의 앨범 가운데 최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마법의 성>이 수록된 더 클래식의 첫 앨범을 꼽았다. 원하는 음악이 나왔고 제작과 홍보 등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데다가 앨범 다자인도 흡족했다는 것이다. “재킷이 완성되어 처음 봤을 때 디자인이 내가 상상한 그대로가 나온 거예요. 음악과 딱 맞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맘에 쏙 들었어요.”
앨범 디자인은 하나의 장식이나 전시도구가 아니라 음악을 뒷받침 하고 동행하는 예술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김광진의 예가 말해준다. 과거 음반 전성시대에 커버 디자인은 음악만큼이나 중요했다.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음악과 어울림을 빚어내는 앨범 재킷을 꾸려내기 위해 일급 디자인예술가와 사진작가를 초빙해 작업하곤 했다. 지금은 MP3 음원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커버와 음악정보를 거의 챙기지 않지만 과거에는 음악스타일을 반영한 앨범 커버 디자인이 절대적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억하는 명반 가운데 재킷이 명작이 아닌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앨범 커버는 따라서 음악 팬들의 자기 방 혹은 공식적인 갤러리의 훌륭한 전시품목의 하나였다.
앨범 디자인이 갖는 파괴력은 역사적 명반, 혹은 명반 중의 명반으로 꼽히는 비틀스의 1967년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로 증명된다. 당대 영국의 모던 아트 선구자인 로버트 프레이저가 디자인한 이 앨범은 애초 그 무렵 앨범커버를 지배했던 사이키델릭 스타일이었으나 프레이저는 그런 디자인으로는 당대에만 어필할 뿐 세월을 이겨낼 수 없다고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에게 강력하게 설득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역사적 인물 70명을 실물 크기의 카드보드로 만들어 그것을 비틀스의 뒤에 배치해 사진촬영 작업을 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콜라주 방식을 활용했다. 디자인 비용은 총 2870파운드가 소요되어 현 화폐가치로 약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다. 이 제작비는 당대 일반적인 앨범 디자인비용의 100배에 달했다고 한다.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쓴 것이다.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그해 그래미상의 ‘올해의 앨범’과 더불어 ‘올해의 앨범 커버’상을 수상했다. 이후 많은 팝 가수와 음반제작자들은 음악만큼이나 음반커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감하며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야 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을까. 이듬해 1968년, 기인이었던 프랭크 자파(Frank Zappa)는 비틀스의 <서전트 페퍼..>를 비꼬는 패러디 디자인으로 <위어 온리 인 잇 포 더 모니(우리는 그저 돈 때문에 하는 거야!)>라는 제목의 앨범을 출반했다. 이 작업으로 칼 쉔켈(Cal Schenkel)은 디자인예술가로 유명해졌다. 그는 1969년 전위적인 소음 사운드로 일관한 캡틴 비프하트의 명작 <트라우트 마스크 레플리카(송어 안면 복제)>도 작업했다. 사람의 안면 자리에 송어에 모자를 씌운 형상으로 대신한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독특함이나 각별함으로 따지면 비틀스의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몇 개월 전에 선보인 무명 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와 여성 가수 니코(Velvet Underground & Nico)의 앨범 커버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커버 아티스트는 그 유명한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Andy Warhol). 재킷은 오로지 노란 색 바나나에 앤디 워홀의 이름만 프린트되어있다. 가수의 이름이 커버에 없는 것으로는 아마도 사상 최초일 것이다. 그는 남성 청바지의 지퍼를 실제로 커버에 만들어, 초기 발매 분은 심지어 열고 닫을 수 있게 해 파문을 일으킨 롤링 스톤스(Rolling Stones)의 명반 <스티키 핑거스>(1971년)도 디자인했다.
1970년대 음악예술의 전성기를 맞이해 음반 커버는 한층 진화를 거듭해 더욱 다양하고 예술적인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연 걸작은 디자인 팀 힙그노시스, 조지 하디, 스톰 써거슨, 오브리 파웰 등이 공동 작업한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의 1973년 작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다. 퍼지는 프리즘을 내건 이 검은 색 앨범은 밴드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간결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밴드공연의 조명, 앨범의 가사 그리고 멤버 릭 라이트의 ‘단순하면서 대담한 디자인’ 지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잘 반영해냈다. 이때부터 팝가수 특히 록밴드의 앨범은 멤버들 사진이나 심지어 그룹 명이 커버에 없는 디자인이 유행처럼 번졌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수록된 전설적인 레드 제플린의 4집(1971)은 나무 지게꾼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을 뿐 가수나 앨범 타이틀이 전혀 없다. 이 점에서 가수의 얼굴만을 대문짝만하게 내거는 미국의 컨트리 앨범이나 우리 트로트 가수의 앨범은 디자인 개념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그룹 이름의 로고를 강조하는 디자인도 1970년대에 보편화되었다.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예스(Yes), 퀸(Queen), 아바(Abba),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이 여기에 속한다. 그룹 로고만으로도 디자인의 진전을 이룩한 셈인데 국내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서태지를 들 수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작은 멤버 사진을 쓰고 있지만 1993년 2집 <하여가>부터는 로고와 색상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이전과 성공적인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듀스, 시나위, H.O.T 등 많은 가수들이 이 방식을 선호했다.
옛날 미술가의 작품을 써서 커버 명작을 생산해낸 사례도 있다. 에릭 클랩튼의 록 클래식 ‘레일라’가 담긴 데릭 앤 더 도미노스(Derek & The Dominos)의 <레일라 앤 아더 어소티드 러브 송스>, 그룹 캔사스(Kansas)의 데뷔앨범 그리고 최근 것으로는 유진 들라크루아의 작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쓴 콜드플레이(Coldplay)의 <비바 라 비다>가 있다. 콜드 플레이 앨범은 2008년 하반기에 출시된 것임을 전제하면 MP3 음원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풀 앨범은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국내에서는 앨범의 전성시대인 1980년대에 와서 커버 디자인의 중력이 높아졌다. 비틀스의 <렛 잇 비> 앨범 재킷을 연상시킨 들국화의 1986년 첫 앨범은 디자인이 음악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을 섬겨 고평을 획득한 케이스다. “수록곡 ‘행진’은 존 레논의 창법을 따라 한 것”이라는 전인권의 말처럼 ‘한국의 비틀스’를 목표한 만큼 그 유사성이 설득력을 지녔다고 할까.
명반은 음원이 전부가 아니다. 음악 말고도 그것을 담은 그릇인 커버의 예술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재킷 디자인이 수준을 기하지 못해 앨범의 음악이미지를 훼손하는 예는 서구나 우리 음악계에 얼마든지 있다. 좋은 앨범 커버는 디자인 자체의 예술성을 넘어서 해당 앨범의 음악지향을 반영해 ‘음악의 예고편’ 역할을 수행한다. 일례로 인디 선풍을 야기한 ‘장기하와 얼굴들’의 2007년 앨범만 하더라도 커버만으로 아티스트의 음악 집중력을 읽을 수 있다. 음악관계자들은 “음악을 듣기도 전에 앨범 커버만 봐도 이 앨범 음악의 질을 가늠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명반은 그리하여 앨범 커버도 명작이다. 음악은 디자인과 운명적으로 동행하는 셈이다.
둘이 만나 시청각 예술의 즐거움을 증폭시키며 감동을 저장하는 것이라고 할까. 음악의 감동을 만끽한 사람치고 그 음악이 실린 앨범의 커버를 떠올리지 않는 자 누구인가. MP3 음원만을 접해 앨범 디자인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즐거움의 반을 놓치는 것이다. 음악의 디자인 인식부재는 듣고 난 뒤 지워버리는 음악 소비풍조를 더욱더 재촉한다. 저장 아닌 소비시대의 짙은 그림자다.
review
게시물이 없습니다
Q & A
게시물이 없습니다